(조선일보 9월 5일자 기고칼럼)
나는 탈북자다. 서울 정착 나이로 치면 올해 10살이다. 자유민주주의 ‘미성년자’인 셈이다. 이런 내 눈에도 남한의 진보가 참 철없어 보인다.통합의 진짜 목적과 정체를 드러낸 ‘통합진보당’의 수준을 보아서가 아니다.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행태가 안쓰러워서다.
내란음모에 대한 반감에 앞서 촛불의 장래나 걱정하는 그 한숨 또한 참으로 가벼워 보여서이다.물론 일부의 표현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속엔 가끔 ‘정신병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이석기 문제는 개인의 히스테리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현재 남한내 진보의 가치가 그만큼 병들었음을 고발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이유는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을 허용한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어깨 걸고 늘 시위도 함께 했고, 마이크를 쥐는 선동의 앞자리도 내어 주었다.
극소수 ‘통합종북’의 그 극렬함을 ‘진보의 양심, 진보의 행동’으로 치켜세우지 않았던가? 이석기가 외쳤던 “진보의 통일”이란 내란음모의 적화통일이었고, “진보의 자주”란 김일성 민족주의였고, “진보의 평화”란 북핵 지지였는데도 그 진가를 가려볼 줄 몰랐던 눈 먼 진보가 아니었던가?
그 이유는 탈북자가 보기에도 명백하다.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의 권력을 원했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라면 종북도 괜찮다는 그 조급한 세력야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방식도 거칠 수 밖에 없었다. 어떤 데모를 해도 선동진보였고 과격진보였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동물에 비하는 예의 없는 진보였고, 갓난 아기를 방패로 삼는 비정한 진보였다. 쇠파이프로 주장하고, 공공기관의 재물을 부셔도 되는 불법의 진보였다. 그 현장에서 나는 진보의 억압을 느꼈다.
물리적 독재만 알던 탈북자에게 진보의 독재도 보게 한 분명한 가치진보의 훼손이었다. 북한 독재에는 침묵하고 주민들의 인권엔 분노할 줄 모르는 기만의 진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도 파괴하려는‘통합진보’의 내란음모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와서 종북과의 결별! 그 한마디로 단번에 정리될 남한의 진보가 아니다. 제1야당의 로고와 상징색깔을 바꾸었듯이 진보의 가치와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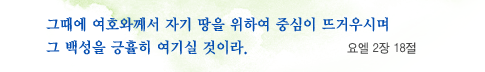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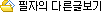





 등록일 : 2013-09-07 (09:34)
등록일 : 2013-09-07 (09:34)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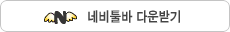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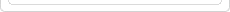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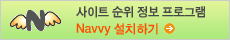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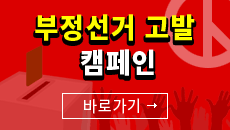


 빌립보서1장20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빌립보서1장20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잠언31장2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잠언31장2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잠언31장1르무엘왕의 말씀한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31장1르무엘왕의 말씀한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