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말, 당시 누가 누구를 돌볼 새 없었고 너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만 했던 무서운 식량난에 우리 집과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3천명 정도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는 하루 4명까지 굶어죽는 날이 있을 정도였다.
필자의 옆집에는 여섯 식구가 살았는데 남편이 굶어죽고 며칠이 지나 아내마저 기관지병으로 사망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먹지 못해 바깥출입도 하지 못했다. 그나마 막내아들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에 배치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형제들과 아무것도 없는 집 천정만 바라보았다.
누구나 처지가 똑같은지라 인심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웃간에도 누가 사는지 죽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결국 2주 후 그 집 맏아들이 목숨을 잃었고 한 달 후에는 둘째가 굶어서 사망했다. 이렇게 여섯 식구나 되는 대가족의 대부분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죽음을 당했다.
그나마도 일찍 죽은 사람은 나무로 관을 짜서 땅속에 묻어주었다. 그래서 흔히들 식량난 초기에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들 말했다.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죽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모자라 생전에 덮고 자던 이불에 둘둘 말아서 땅에 그대로 묻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도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 집에 이불이라도 있는 집은 장사를 치를 때 이불을 이용했지만 그나마 이불도 없는 집에서는 시신을 비닐에 말아서 땅에 묻어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렇게 못살고 굶어죽는 것이 ‘미국놈들’ 때문이고 남북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반공화국정책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었다.
1987년 중학교 졸업 후 속도전 청년돌격대 13여단에 배치되어 함경남도 검덕광산 ‘청년 갱’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1989년 북한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연, 아연 등의 광석을 캐는 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었다.
신입대원들에게는 제일 힘든 일, 궂은 일만 하달되었고 아침이면 구(舊)대원들의 세숫물을 떠다주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구 대원들의 심부름과 시중은 죽기보다 싫었기에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래봤자 병실구석이었고 붙잡히기라도 하면 입술과 머리가 터지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대원들은 만나거나 지나칠 때 자기네 ‘지방’이 세다고 으르렁거리며 죽기를 겁내지 않고 싸웠다. 한 번은 잠결에 쾅쾅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구 대원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우리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며 왁작 떠들고 있었다. 일인 즉 낮에 신입대원이 구 대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에 ‘기습’한 것이었다.
곤하게 자고 있던 대원들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얻어맞았고 침대와 벽에는 피가 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울렸고 땅바닥이나 침대에는 피 흘리며 쓰러진 동료들이 나뒹굴었다. 나는 마침 옆에 있던 신발로 전구를 올려쳤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그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 침실로 물러갔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간밤의 어혈(瘀血)로 한 개 소대 30명 중 절반 이상이 움직이기가 곤란할 지경이었다. 그나마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상한 사람들은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별 밖에 보이지 않는 야밤에 돌격대원들이 있는 곳이면 항상 고함소리와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날 병실에는 머리를 동여매거나 담요를 뒤집어쓰고 앓는 소리를 내는 환자들이 일상처럼 등장했다.
어떻게 보면 돌격대는 내가 강해져 상대를 눌러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칙이 판을 치는, 어느 깡패집단의 무지막지한 세계 같았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돌격대인지라 사람인지 악마인지 모를 지경에까지 변해버린 내 자신이 두려웠다. 군대건 보안원(경찰)이건 무서운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노인, 어린이와 부녀자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오죽하면 검덕 주민들은 돌격대가 아니라 ‘야만대’라고까지 불렀겠는가.
산에서 땔나무를 하루 두 대 해오는 일이 돌격대에서의 첫 일감이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왜소한 대원들이 저보다 곱절이나 큰 통나무를 끌어내리는 일은 강제노동이나 다름없었다. 하루 계획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 총화시간에 김일성의 노작 학습을 시켰으며 그마저도 잘못하면 한 줄로 세워놓고 몽둥이로 가차 없이 두들겨 팼다.
그 때 식당에서는 강냉이밥과 국을 주었는데 식사량은 말할 수 없이 적었다. 밥은 그릇에서 숟가락으로 건지면 3~4숟가락에 불과했고 국은 배추나 시래기를 가을에 말려놓은 것을 물에 불렸다가 소금을 넣고 끓인 것이 전부였다. 그것을 먹고 통나무를 끌어내리자니 힘이 모자랐고 때문에 두 달째가 되자 급기야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겨울에 들어서면서 어떤 날은 영하 37~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는데 북방에서 자라면서 추위에 단련된 우리도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동상을 입어서 발가락이 얼어붙고, 손가락이 얼어 터져 곪아서 진물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는 발목을 자르는 사람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이면 중대별로 식사를 하는데 얼어붙은 밥을 숟가락으로 뜨면 서걱서걱하는 얼음소리가 났고 국물은 차가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눈 내린 날이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산으로 올라가 통나무를 끌어내려야 한 탓에 아침에 산에 갈 때면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처럼 산이 그렇게 무섭고, 밉고, 야속할 수 없었다.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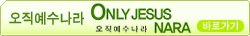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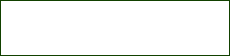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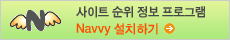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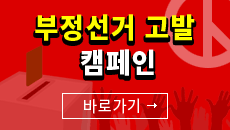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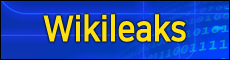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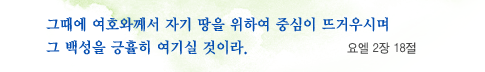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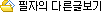





 등록일 : 2010-07-26 (09:58)
등록일 : 2010-07-26 (09:58)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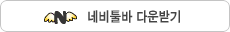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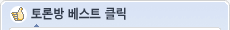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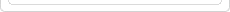

 아가서2장14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2장14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잠언31장9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찌니라
잠언31장9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찌니라
 잠언30장8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찌니라
잠언30장8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찌니라